글을 쓰는 사람은 마음을 다루는 태도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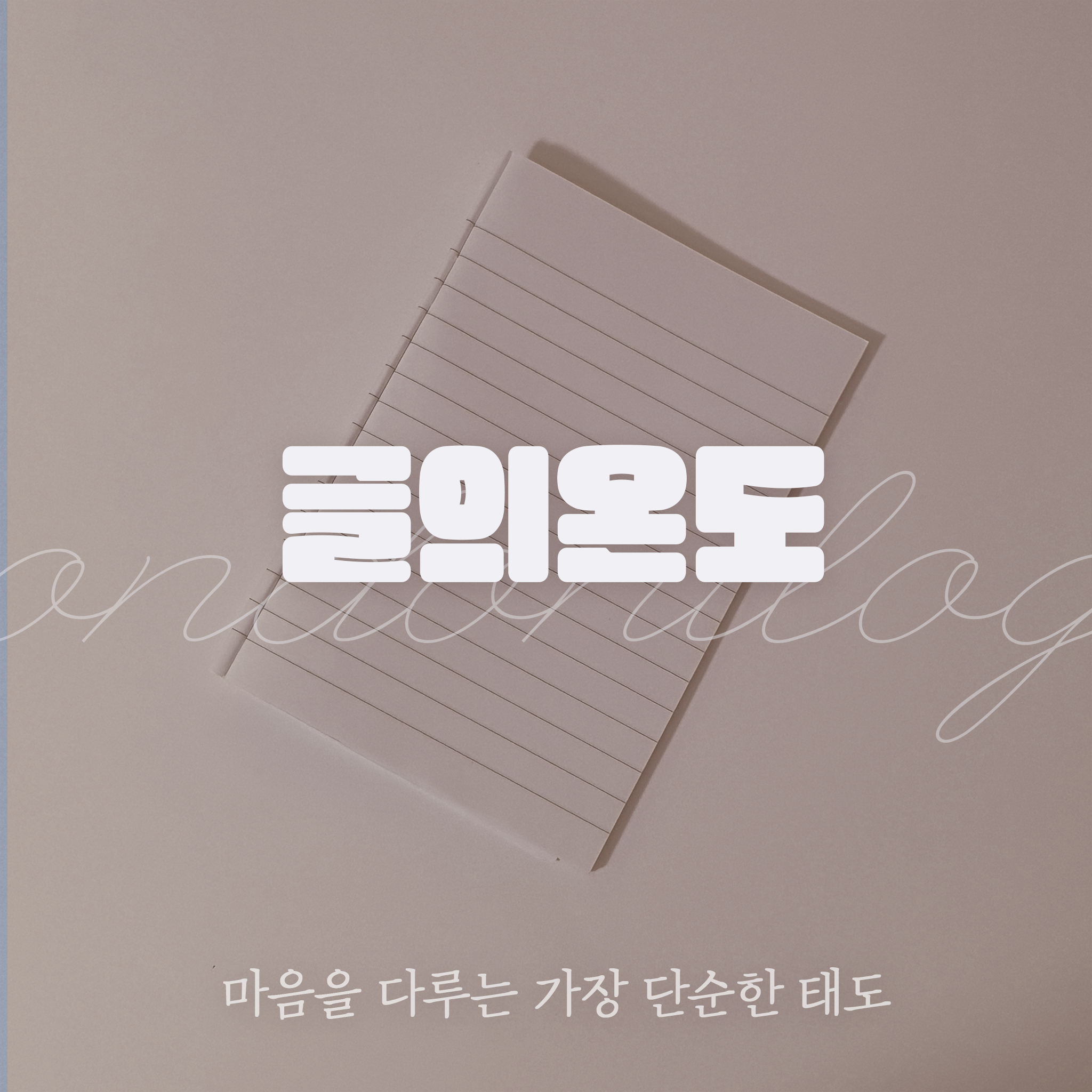
☁️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사람은 글을 쓸 때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문장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고, 생각을 정리하려면 마음의 움직임을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종종 흔들린다. 마음이 조용할수록 글은 또렷해지고, 복잡할수록 문장은 엉켜버린다. 나는 그 흔들림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의 불안은 감정을 다루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오르내린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글은 그런 변화를 기록하는 도구이자,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다.
나는 오래전부터 글을 쓰며 느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문장은 단단해지지만, 동시에 공기가 메마른다는 것을. 반대로 감정을 그대로 두면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질서가 흐트러진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 같다. 감정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 그 거리감이 글의 온도를 결정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온도는 따뜻함이나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율하는 정도다. 그 온도가 일정할수록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 글은 마음을 조율한다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리하고, 그 안의 리듬을 찾는 일에 가깝다. 문장을 다듬는 동안 마음은 한층 천천히 식는다. 그래서 글은 조용한 조율의 도구다. 말로는 다루기 어려운 생각도 글로 옮기면 형태를 가진다. 형태를 가진 생각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글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형태의 질서 때문이다. 생각이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 감정은 언어의 틀 안에서 숨을 고른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적는 편이다. 다만 표현을 줄인다. 감정을 줄이는 대신, 상태를 묘사한다. 불안하다 고 쓰지 않고 마음이 빠르게 움직인다 고 쓴다. 그렇게 단어를 바꾸면 시선이 감정에서 상태로 옮겨간다. 그 순간 글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잔잔해진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마음의 리듬을 관찰하는 일이다. 감정의 강도보다 흐름을 보는 태도,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온도다.
🍃 기록으로 마음과 거리를 둔다
기록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그와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생각과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중심이 흔들린다. 하지만 그 감정을 글로 적어내면,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기록된 문장은 독립된 대상이 된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금 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글이 그 사이에 얇은 막을 만들어준다. 그 막이 바로 마음의 여백이다. 여백이 생기면 판단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 평온이 찾아온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마음과 자신 사이에 관찰의 거리를 두는 일이다. 너무 가까우면 휩쓸리고, 너무 멀면 닿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글쓰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대신 기록으로 다룬다. 기록은 감정을 정리하는 행위이자, 그 감정이 나를 덜 흔들리게 하는 도구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적어둔 문장을 통해 자신을 배운다.
🌾 글쓰기의 루틴이 마음을 지탱한다
글을 쓰는 일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펜을 잡으면 마음도 그 리듬에 맞춰 고요해진다. 생각이 복잡한 날에도, 글을 쓰는 자리에 앉으면 마음은 자연히 천천해진다. 그건 반복의 힘이다. 반복은 단조로움을 만드는 대신, 안정감을 만든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의 불규칙한 파동이 점차 줄어든다. 나는 그 리듬을 글로 맞춘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단 한 문장만 써도 좋다. 오늘은 조금 불안했다는 문장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감정의 내용이 아니라 기록의 리듬이다. 그 리듬이 쌓이면 마음의 균형이 세워진다. 글쓰기의 루틴은 결과보다 상태를 정리하는 행위다. 그래서 나는 글을 성과로 보지 않는다. 글은 언제나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단정해진다.
🌿 글을 쓰는 태도는 마음을 다루는 태도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문장을 고르는 일은 감정을 다루는 일이고, 단어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의 순서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의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다. 성급한 문장은 마음의 불안을 드러내고, 단정한 문장은 생각의 질서를 보여준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장도 흔들린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배운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는 욕심보다, 오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 문장은 사람의 마음처럼 일정하지 않다. 어떤 날은 또렷하고, 어떤 날은 흐리다. 하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글쓰기의 본질이다. 글을 쓰는 태도는 마음을 조율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 조율의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간다.
🍃 온도를 유지하는 글쓰기의 질서
글에는 마음의 온도가 있다. 너무 뜨거우면 감정이 문장을 삼키고, 너무 차가우면 생각이 멈춘다. 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거리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 균형을 ‘기록의 질서’라고 부른다. 기록의 질서는 감정의 흐름에 규칙을 부여하고, 그 규칙이 마음의 평형을 만들어낸다. 글을 쓰며 마음의 온도를 관찰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조율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을 일상의 중심에 둔다. 하루의 리듬이 불규칙해도 글의 리듬만은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 리듬이 하루의 질서를 만든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단어를 세우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고, 문장이 완성될 때쯤엔 감정의 파도도 잔잔해진다. 글을 쓰는 사람의 온도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 글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글을 쓴다는 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바라보는 일은 곧 이해하는 일이다. 나는 글을 통해 스스로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한 문장을 쓰려 했고,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의 질서를 찾았다. 결국 글은 마음의 지도다.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보인다.
글을 쓰는 사람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건 그 온도를 억누르지 않고, 다만 관찰하는 일이다. 오늘의 글이 어제보다 단정하다면, 그만큼 마음이 정리된 것이다. 글을 쓴다는 건 그런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다. 글이 곧 사람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마음을 다룬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리고 그 글이 나를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든다.